미국적 종교지형은 어떻게 탄생했나
처음 도착 국교, 종교 자유 불허
청교도들 계속 ‘신대륙’ 몰려와
어느 교파도 압도적 선교 못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시장경제적 종교지형’ 속에서
경쟁하되 공존하는 독특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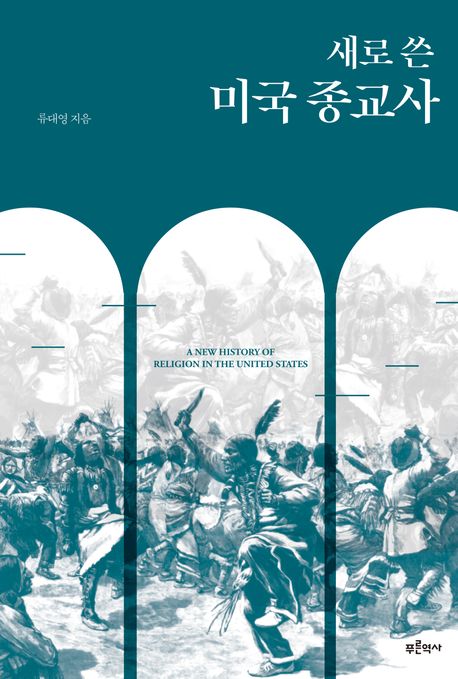
새로 쓴 미국 종교사
류대영 | 푸른역사 | 580쪽 | 30,000원
“미국에서 종교는 한때 국가와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사회통제 기관들을 유지했으며,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다. 또한 종교는 사회규범을 제시하고 개혁의 동력이었으며, 젊은이들을 사회화시키고, 여가 활동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했다. 미국의 종교는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 …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다. 1885년 최초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의사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 그리고 1885년 성경을 들고 한국을 찾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와 아펜젤러(1858-1902) 선교사 등에 의해, 한국인들에게도 드디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2007년 <미국 종교사>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미국 종교 관련 통사를 쓴 저자는 은퇴를 앞두고 많은 인용문과 각주를 보태고 새로운 통계를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판 격으로 미국 대륙 600여 년 종교 역사를 집대성한 <새로 쓴 미국 종교사>를 내놓았다.
저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땅의 종교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특히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도전들에 응전해 왔는지 소개하고 있다. 피습 위기를 겪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조차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신앙을 고백할 정도의 기독교 국가로 보이지만, 오늘날 미국 종교시장에서 승리한 것은 어떠한 종교도 교파도 아닌, ‘무종교’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미국은 오늘날 최대 기독교 국가이지만, 2천 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원류나 발상지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종교사’는 ‘미국 교회사’가 될 순 없다. 역사가인 저자는 책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그 땅의 종교와 정치·경제의 상호 영향을 소개하고자 노력했다.
미국, 아니 북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러했듯 한 번쯤 들어봤을 ‘체로키(Cherokee)’ 신화처럼 나름의 종교와 문화를 갖고 있었다.
유럽인이 미국에 당도하기 전 미국 지역에는 최소 500개의 독립된 원주민 문화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 다양한 부족들은 각각 독특한 종교문화를 갖고 있었다. <기생충> 막바지 기택(송강호)이 분장했던, 흔히 ‘인디언’이라 불리는 그들 말이다. 당시 원주민들도 어떤 초월적 세계의 존재를 믿었다고 한다.
미국 대륙에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온 건 가톨릭이었다. 가톨릭 국가였던 에스파냐(스페인)와 프랑스의 ‘신대륙’ 진출에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동행했고, 특히 프랑스 여성 선교사들은 아직 누구도 선교 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흑인 노예’들에게도 관심을 쏟았다.

이후 영국도 미국 땅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진출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목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아메리카대륙 식민지 최초의 의회인 버지니아 의회(Virginia House of Burgesses)는 1619년 의회를 시작하는 모임에서 식민지를 ‘성공회와 도덕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고, ‘모든 식민지 주민의 성공회 주일예배 의무 참석’과 ‘게으름, 술주정, 노름, 사치한 옷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영국 왕립 식민지(royal colony)가 된 버지니아는 국교(성공회) 외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영국 본토에서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분리파’ 공동체는 국교회의 핍박을 견디지 못했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Mayflower)를 타고 이듬해인 1620년 9월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해 이 버지니아 북부를 향했다.
저자는 여기서 배를 탄 전체 승선원 102명 중 ‘순례자들(Pilgrims)’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배에는 ‘낯선 사람들(strangers)’ 즉 상업적 이주민들이 더 많았으며, 이후 미국의 역사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주장한다.
출항 3개월 후 메이플라워 호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Cape Cod)에 도착해 자유로운 신앙과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뉴플리머스’에 정착했지만, ‘험한 짐승과 사람들’로 가득 찬 신대륙에서 첫 겨울을 나는 일은 가혹했다. 이듬해 10월, 첫 ‘추수감사 축제’를 벌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 102명 중 일부에 불과했다.

청교도들은 계속 ‘신대륙’으로 몰려왔고, 교인들의 신앙과 행실을 강제했던 회중교회는 ‘뉴잉글랜드’에서 활짝 꽃피어 1700년 120곳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비롯해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퀘이커까지 등 유럽 대륙의 각종 개신교가 들어왔고, 미국이 독립하는 17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민이 급증하면서 선교의 기회도 늘었지만, 각 교파가 조직을 만들고 교단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느 교파도 압도적 힘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교파들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전체 인구의 17%만이 교회나 회당에 다니는 ‘매우 세속적인 나라’였다는 사실도 의외다.
이는 국교 없이 정교분리, 정치와 교회가 철저히 분리된 ‘시장경제적 종교지형’ 속에서 한편으로 경쟁하되 다른 한편으로 서로 관용하며 공존하는, 미국 기독교의 독특한 성격을 이뤄냈다.
책에서는 이 외에 독립과 건국에서의 종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휫필드, 찰스 피니 등 제1·2차 대각성, 서부 정복과 원주민 기독교화, 노예제도와 종교계 분열, 흑인(아프리카계)의 삶과 종교, 종교다원주의와 ‘개신교 미국’의 종말 등 시대별 미국 기독교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인 비율은 1860년 전체의 37%, 1890년 45%, 1906년 51%로 계속 높아졌다. 증가세는 지속돼 1926년 56%, 1980년 62%까지 올라갔다. 1790년 400만 명도 되지 않은 미국 인구가 1850년 2,300만, 1900년 7,600만, 1950년 1억 5,100만, 1980년 2억 2,600만 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종교인 비율이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났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인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미국인들은 ‘무신론과 무종교’를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물질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와 AI 발달 등으로 한국은 이러한 현상이 더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 쓴 미국 종교사>에서 배우거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다. 그리고 종교는 외부의 영향력에 놀랍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유달리 강한 생명력을 지닌 현상이다. 그러나 21세기 초 미국 종교시장이 보여준 상황은 인간의 종교성이나 종교의 의미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종교들이 뚜렷이 쇠퇴하는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이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득과 학력이 높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