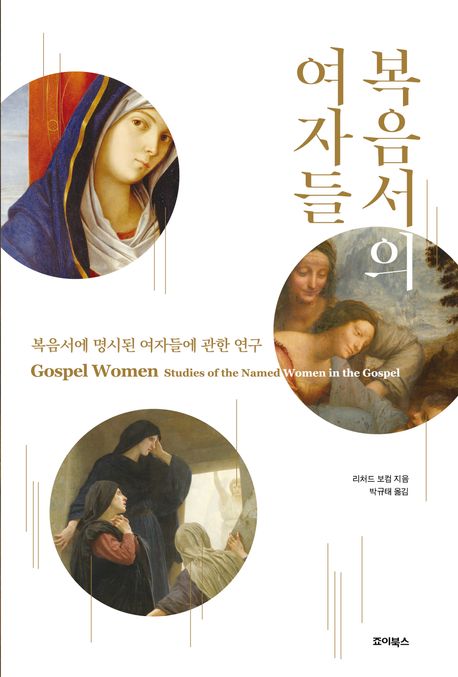영국 신약학자 리처드 보컴 저서
엘리사벳·마리아, 비천한 처지
낮은 지위 모든 사람들 대표해
선지자 안나, 디아스포라 상징
사도 요안나, 사도행전 유니아?
글로바의 마리아와 두 살로메,
성경 텍스트와 이름 연구 통해
복음서의 여자들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복음서의 여자들
리처드 보컴 | 박규태 역 | 죠이북스 | 560쪽 | 45,000원
<복음서의 여자들(Gospel Women)>은 <예수와 그 목격자들>,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등으로 알려진 영국 신약학자 리처드 보컴 교수(Richard J. Bauckham)가 ‘복음서에 이름이 나온 여성들(the Named Women in the Gospel)’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짚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룬 논문들을 모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구약성경의 ‘룻기’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 중심 관점’ 성경 읽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또는 가부장제에 대항하려는 ‘페미니스트 신학’과 다소 다름을 보여준다. 성경 배경인 가부장제를 인정하더라도 여성 중심적 성경 읽기가 충분히 가능하며, 남성 중심 시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본문들도 여성 중심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
“많은 페미니스트 성경 비평가와 달리, 나는 정경을 절망스러운 가부장제로 뒤덮인 구조물로 여기지 않는다. 성경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남성 중심 시각이 초래한 결과는 진짜 여성 중심 시각을 담고 있는 본문이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상쇄될 수 있다.”

저자는 독자나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페미니즘이든 남성 중심주의든 상관없이, 무엇보다 각 텍스트 자체의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론을 강조한다.
2장 ‘메시아의 이방인 여자 조상들’에서는 마태복음 속 예수의 계보에 올라간 네 명의 여성(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을 모두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메시아를 염두에 둔 계보 전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며, 메시아의 여자 조상이 됐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역할의 ‘포용성’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저자는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된 여성들을 한 명씩 살피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무언가의 대표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주목했다. 이를 통해 복음서는 주로 예수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 이야기가 갖는 본질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따른 많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다.
특히 복음서 속 여성들의 ‘이름’에 주목한다. 역사 연구 자원에서 아주 빈번히 활용되지만 신약 연구에서 대체로 무시해 온 것이 바로 ‘이름 연구(고유명사 연구, onomastics)’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대 증거는 본질상 이름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증거는 계속 늘고 있다”며 “우리는 아주 많은 고대 사람의 이름을 알지만, 이름 말고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 많지 않다. 꼼꼼히 활용하기만 하면, 이름이라는 증거는 많은 정보를 일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저자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안나’의 이름을 통해, 그녀가 메디아(메대)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였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특히 그녀가 ‘아셀 지파’임을 기록한 것은, 예수 이야기가 포로 출신이든 남아있던 사람이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전체를 아우름을 의미한다.
성경에 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요안나’에게 저자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알고 보니 누가복음 8장 3절과 24장 10절 두 곳이나 등장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를 저자는 ‘사도’로 호칭하면서, 티베리아스에 살던 헤롯 궁정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여럿 제시한다. 특히 요안나가 로마서 16장 7절에 언급되는 사도 유니아와 동일인일 개연성도 주장하고 있다. 글로바의 마리아, 두 명의 살로메도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을 비롯해 온갖 비천한 처지와 낮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됐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신 목적의 성취를 암시한다. 저자는 여기서 성경 연구에 널리 사용된다는 ‘상호본문성(intertextuality)’을 활용했다.
이 시기에 특히 주목받는 내용은 마지막 장이다. ‘여자들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여(女)제자들’인 점에 대해 신빙성을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근래 페미니스트들이 복음서 내러티브조차 부활 신앙의 기원에서 여자들이 행한 역할을 축소하고 평가절하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결국 그런 평가절하조차 “여자들이 역사 속에서 수행한 역할을 더더욱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사실 성경을 보면 당시 이를 직접 들은 제자들도 여성들의 말을 곧바로 믿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에 대해 마태·마가·누가·요한 복음서를 꼼꼼히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도 같은 전승 전달자이며, 그 이야기들의 목격자이자 보증인”이었다고 정리한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서의 여자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저자의 말처럼 흥미로운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