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섭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한국교회의 역사[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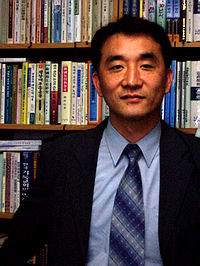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내에는 “신앙생활의 사회화와 실제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나는 자신의 죄만 통회하고 자기 자신만 성결케 하기 위하여 인간사회와 단절하고 은퇴생활로써 만족, 안주하던 기존의 신앙적 자세에 대한 반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도전과 일제의 침탈로 인한 사회경제적 황폐화 현상으로 인한 위기 및 문제의식의 대두이다. 이들로 인해 당시 사회에는 교회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었다. 이에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한 사회현실개조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특히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IMC)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의식은 활짝 개화되었다.
우리는 ‘거리의 성자’로 불렸던 방애인(1909-1933) 선생의 사역에서 신앙생활의 실제화의 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녀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당시 제도권 교회에 식상함을 느끼고 무교회주의를 지향했던 김교신까지도 「성서조선」에 친히 그녀를 소개하며 극찬할 정도였다.
그녀는 황해도 황주의 한 재산가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났으며, 부모들이 모두 황주읍교회에 다녔던 까닭에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했다. 좋은 여건 덕택에 그녀는 일찍 신교육을 받으며, 1926년 호수돈여고를 졸업했다. 그리고 그해 4월에는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해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물론 그녀의 첫 교사생활은 세상을 모르는 때 묻지 않은 신여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맛보려고 심히 갈급”해 했지만, 결국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1929년 3월에 전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녀는 모교인 양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습관적으로 형성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교적 체험을 갈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했던가? 1930년 1월 10일, 마침내 그녀는 “눈과 같이 깨끗하라”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이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이튿날 새벽에는 “어디로서인지 손뼉치는 소리의 세 번 부르는 음향을 듣고 혼자 새벽기도회에” 나갔다. 그 걸음은 참으로 “아아! 기쁨에 넘치는 걸음”이었다([방애인소전], 8).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당시 전주서문교회의 배은희 목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양은 벌서 제1기(1926-1929)의 방 선생은 아니었다. 향수니 크림이니 하는 화장품은 자취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값진 주단이니 세루니 하는 옷감조차 그에게선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얼굴 그대로의 사람이요. 검박한 단벌옷의 사람이었다.” ([방애인 소전], 7)
이는 1931년 9월에 그녀가 다시 기전여학교의 부름을 받고 전주로 내려갔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전의 최고급 의상에 화장으로 꾸몄던 신여성의 모습이 사라지고, 대신 순수하고 검소한 여인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신여성들을 매료시켰던 세상의 멋과 자랑은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순간의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도는 그녀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비와 기쁨을 깊이 맛본 자만이 진정으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에 깊이 헌신할 수 있으리라. 그녀의 삶이 바로 그랬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전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전주 사람들에게는 낯익은 풍경의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학생들에게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다가서는 사랑의 교사가 되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와 어머니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의 그림자가 떠나가며 새로운 생명력이 용솟음쳐 올랐다.
한편, 방애인은 그녀를 찾는 흉측한 모습의 나병환자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둥병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24세의 처녀의 손으로 그들의 썩어가는 살결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다.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이 내 손을 통하여 이 괴로운 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시여,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마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는 상처로 깊은 골이 생긴 그들의 마음깊이 그리스도의 씨로 심겨졌으며, 그들의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은 그들의 썩어가는 살을 소생케 했다([방애인소전], 16).
이처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헌신적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녀의 모습은 점차 성자의 모습으로 전주 시민들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번민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그녀는 육체적인 과로로 인해 몸져누울 때가 많아졌다. 게다가 부친이 첩을 얻어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되자 정신적인 충격도 컸다. 이에 그녀는 부친을 위해 아침 금식기도를 시작하여, 죽기까지 20개월 동안 변함없이 지속했다(이덕주, 256-7).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찾아온 장티푸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1933년 9월 16일 전주에서 24세를 일기로 자신을 사랑하던 지인들의 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물론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는 그녀가 20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부친도 돌아와 딸의 여윈 손을 만지며 눈물짓고 있었다. 그녀의 장례는 전주시민 전체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교회를 향한 불신의 악취를 풍기던 사회 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뿌려 놓았던 것이다.

























